“‘면적·자원’한정 속 인간과 자연 공존 모색할 때”
오랫동안 자연이 주는 혜택 적응하며 살아
이젠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일방적 강요 한계
인간이 저지른 개발 등 억제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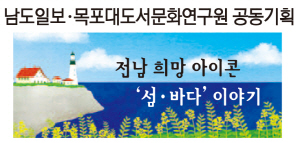
남도일보·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공동기획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
<39> 섬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면적·자원’한정 속 인간과 자연 공존 모색할 때”
오랫동안 자연이 주는 혜택 적응하며 살아
이젠 더 이상 자연에 대한 일방적 강요 한계
인간이 저지른 개발 등 억제 필요성 ‘제기’

섬은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적으로 걷는 방법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섬에서 외부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수영을 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어제와 오늘은 풍랑주의보로 목포 주변의 항로가 통제되었다. 개인적으로 도초도에 갈 일이 있었지만, 항로 통제로 개인적 일은 영상을 통해 진행되었다. 섬은 이렇게 날씨에 따라 육지보다 이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요즘은 회의나 국내외 학술대회를 줌(zoom)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였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부터 이러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시스템도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시대가 마침내 현재 우기가 사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현재도 자연에 기대어 살지만, 과거에는 거의 모든 것이 자연에 따라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전라도음식이 유명한 것은 왜일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라도는 산과 평야, 바다, 갯벌 등 생물종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서식처가 있다. 다양한 서식처에서 나는 많은 재료(생물)가 있으니 이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고민과 실험의 시간을 거쳐서 현재의 다양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거의 모든 먹을거리를 자연에 기대어 살고 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IT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 비교해서 자연에 덜 의지하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자연의 도움 없이 우리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 숨을 쉬거나 물을 마시거나 모두가 우리들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다.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는 삶의 전적인 대부분을 자연에 의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에 대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생태계서비스는 2005년 유엔의 The Mellennium Ecosytem Assessment(MA)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와 많은 학자가 함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전통지식(전통생태지식, 환경지혜 등으로도 불림)이 생태계서비스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질이 좋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섬에서는 제한된 면적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소비해서 다음에는 그것이 자랄 수 없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터섬 가설처럼 섬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류의 흔적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섬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연이 주는 혜택에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어떤 생물은 언제 나고 언제 먹어야 하고,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또는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전통지식들이 쌓이면서 전달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섬의 노인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반면에 생산가능 연령인 15~64세까지 인구는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줄고 있다. 섬에 살던 원래의 인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인구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해서 섬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자식을 많이 두지 않으면서 전통지식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전달받을 기회가 적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이러한 상황을 가속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서 한국전통지식포탈(https://www.koreantk.com/ktkp2014/)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통의료, 전통식생활, 전통생업기술, 문화적 창조기술, 유전자원으로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전통지식을 구분하고 있다. 전통지식으로 총 2만 5천479건이 기록되었고, 이 가운데 생업기술은 총 4천 507건, 생활기술은 2만 624건, 창조적기술은 1천 24건이다. 하지만 생업기술에서 어업에 관련된 것은 단 1건으로 참조기의 어황 변화와 예측에 관련된 논문이 포함된 것이 전부이다. 대부분이 문화컨텐츠나, 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록해 놨다. 또한, 어업(맨손어업 포함)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봄에 중년의 아줌마들이 밭두렁이나 집 근처 산자락에서 쑥을 캐는 광경을 본 한 외국인이 “왜 저 사람들은 잡초를 캐고 있는가?”라고 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다양하게 먹기도 하고 약재로 쓰기도 한다고, 생각보다 흔하지만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뒤에는 우리들의 아이 중 누군가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섬에서는 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인간인 우리가 이제는 자연에 양보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 우리 주장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보의 방법인 전통지식에 대해서 대를 이어 전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글/김재은(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정리/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