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광산 개발, 대표적인 세계 인권침해 현장 ‘공분’
일본 군함도·사도 조선인 강제징용 ‘아픔’ 간직
완도 노화도 활석 노천광산 지역경제 견인 역설
진도 가사도 등 전국 곳곳 개발…환경문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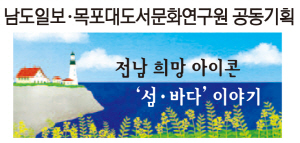

섬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평범한 공간이지만,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와 통치 방식에 사용되어 온 것은 세계 공통적인 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2019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섬(端島·일명 군함도로 잘 알려진 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섬 광산 노역과 인권 침해에 대해 세계인들이 공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하시마섬에서 있었던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일본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
최근 일본이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佐渡)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서서 다시 한 번 주변국의 지탄을 받고 있다. 사도섬에 위치하는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년) 일본 최대의 금·은 생산지로 알려지면서 1603년 도쿠가와 막부시대 급속하게 개발된 광산이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사도광산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의 호박,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의 예술의 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直島)도 사실 알고 보면 근대 일본 산업화 과정에서 채석장, 광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으로 사용된 희생의 장소이다.
이태리 사르데냐의 경우, 부속섬인 아시나라섬(Asinara Island)은 아름다운 경관임에도 불고하고, 중세시대부터 악명 높은 정치인 유배의 섬, 흑사병 환자 격리섬, 마피아 감옥 등으로 이용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서 아시나라섬은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한 시대의 국제적, 국내 정세에 따라서, 산업기반에 따라서 섬의 자원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섬 광산, 특히 금광 개발은 우리나라 남도 섬에서도 많이 이뤄져왔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최대 해저금광이었다는 통영광산은 장좌도에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의 전사(戰史)에서도 등장했던 장좌도인데, 일본에 의해 금광으로 알려진 것이다. 순도가 높은 금이 생산된다는 소문을 듣고 일제는 섬을 절단 내고, 깊게 갱도를 냈다. 갱도가 해저 200m 아래까지 연결될 정도였으니 당시 엄청난 개발이었다. 흙은 광석을 운반하는 길을 만드는데 이용하였고, 장좌도와 육지는 결국 연결되어 섬 형체의 기억이 사라졌다. 황금의 섬이 장좌도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현재도 우리 주변에서는 섬을 파헤치고, 절단 내는 현장을 자주 본다. 전복의 섬으로 잘 알려진 완도군 노화도에는 일명 ‘곱돌‘이라는 활석(滑石)을 생산하는 노천 광산이 있다. 활석은 화산암이 열수변성 작용을 받아 변성한 암석으로 내화벽돌이나 타일, 도자기 원료, 농약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관광객들에게는 찾기 어려운 곳이지만, 지인의 안내를 받아 광산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고, 섬의 애환과 바다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청정 바다에서 생산하는 전복양식과 함께 이 노천광산의 활석이 노화도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진도 가사도에도 금광이 있다. 국내 모 광업사가 2019년 금 107㎏을 채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밖에 섬은 아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해남군 황산면에도 금광이 있다. 강원도 산에는 석탄, 석회암이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남도의 섬에는 금 생산이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천 광산의 생태복원이 중요한 환경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옥도가 높아 수목 성장에 도움이 되는 토양층, 즉 표토층은 실제로 지표에서 몇 ㎝ 깊이가 안된다.
따라서 노천 광산처럼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나 지하광산에서 퍼 올린 흙을 쌓아놓을 경우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육상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강우에 의하여 침출되는 토양속 중금속은 다시 지하수층으로 흡수되어 바다로 나가게 된다. 섬 지형의 절단은 단순히 형질의 변경 뿐 아니라 섬과 바다 토양과 수질의 영양염류 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주변 해역의 생태계 먹이사슬에 이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무인도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조제를 쌓아올려 자연스러웠던 모래 해변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고, 주변 해안숲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섬 개발은 주로 해안가, 해안선에 가까운 곳에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바다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계상 3,400여개의 유·무인도가 있다(2018년 KMI보고서에 의하면 3,348개로 명시됨).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간척과 매립으로 많은 섬들이 사라졌을 것을 고려한다면, 원래 우리나라 섬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 짐작이 어렵다.
섬은 탄생하면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존재 가치의 의미가 부여된다. 장고한 역사와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것은 황금의 섬이었을까, 광산의 섬이었을까. 근대화의 시대는 끝나고, 초현대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인데도 아직 인간은 노다지를 찾아 섬의 땅을 헤집고, 또 절단 내고, 더 깊은 바닷속 광물을 찾아다니는 욕망의 끝은 한계가 없음을 느끼게 한다. 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아야 섬과 섬 주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역발상을 해본다.
글·사진/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정리/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 = 46.바다 물때지식의 두 체계와 현대적 활용의 혼돈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45. ‘땅과 육지’가 아닌 ‘섬과 바다’로 세상 뒤집어보기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 = 신안 자은도면 둔장마을 ‘리사무소’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기후위기와 농업의 오래된 미래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48]생태 위기 극복하는 보고의 섬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49]제주도 입춘맞이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50]기본소득 논의는 섬지역부터 시작해야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1]뉴노멀 '섬 정체성'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