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육지 여행자 다함께 ‘풍요기원’
하늘에 있는 1만8천 신 굿판으로 초청 ‘초감제’
제장중 ‘입춘국수’ 유혹에 빠져드는 맛도 일품
탐라국 입춘굿 올해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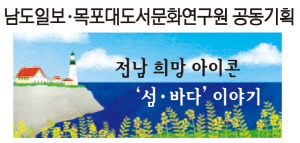



최대 명절인 설날에 가려졌지만, 분명 봄이 찾아왔다. 입춘(立春), 매년 양력 2월 4일 경에 맞이하는 24절기 중 첫째 절기가 입춘이다. 임인년 ‘가장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大寒·1월 20일)과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雨水·2월 19일)의 딱 중간 지점이 입춘이다.
이맘때 제주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다. 대한을 기점으로 벌써부터 입춘맞이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작업은 “희망 기원 제주 전통연 ‘정연’ 만들기”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입춘춘첩 쓰기” “소원지 쓰기”, “입춘춘등 달기” 등이 하나씩 가동된다. 봄의 제전이 시작된 것이다.
#탐라국 입춘굿에 대한 기록
제주도 사람들은 매년 입춘굿을 올린다. 이것을 ‘춘경(春耕)’ 혹은 ‘입춘춘경(立春春耕)’, 또는 ‘춘경친다’고 한다. 제주 입춘굿에 관한 기록은 제주목사 이원조(1792~1871)가 쓴 ‘탐라록’에서 확인된다. 그는 1841년 윤3월에 제주목사 겸 방어사로 부임하여 1843년 6월까지 재임하였다.
그가 제주도에서 보고 듣고 직접 쓴 ‘탐라록’에 의하면, “입춘날 호장(戶長)이 관복을 입고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걸어간다. 그 양옆으로 어린 기생들이 부채를 들고 흔든다. 이를 ‘소목’이라 한다. 심방(제주 무녀)들이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는데, 먼저 관덕정 앞에서 밭가는 흉내를 한다. 이날 관아에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대접한다.”라고 서술되어있다.
제주 화산섬 사람들이 입춘날에 굿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의 주 내용이 농경의례다. 구전에 의하면 “탐라왕이 몸소 백성들 앞에서 밭을 갈아 풍년을 기원하였다는 유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온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
필자는 몇 해 전 제주도 입춘굿을 스케치하기 위해 섬을 찾았다. 입춘이지만 아직 한라산 능선에 눈꽃이 하얗게 머물러 있던 때였다. 아침 일찍 관덕정으로 향하였다. 시내 곳곳을 누비며 지신밟기를 한 풍물패부터 만나기 위해서였다.
2월의 아침기온은 매우 차가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덕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을 촘촘히 살펴보니, 제주도민과 육지 여행자가 혼재되어 있었다. 다소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굿판의 흥을 미리 챙긴 육지 사람과 오랜만에 아들을 앞세우고 읍치로 나들이 나온 노모의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다. 반백의 아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동여매주느라 쩔쩔매고 있었다.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한마당이었다. 햇볕이 조금씩 그 빛을 발할 때 쯤 제주시 삼도2동 풍물패가 객사 앞 도로변으로 진입했다. 관덕정 삼문 앞에는 제주시장이 ‘나무로 만든 소’의 고삐를 단단히 틀어잡고 서 있었고, 심방은 사설을 읊조리며 목우제(木牛祭)를 올렸다. 이것을 제주사람들은 ‘낭쉐코사’라 부른다.
#초감제, 1만 8천 신(神)을 굿판으로 초대
이제 무대는 관덕정에서 망경루 앞마당으로 옮겨졌다. 굿청 옆에 목우가 서 있다. 이제 굿판은 ‘초감제’를 올린다. 초감제란 하늘에 있는 1만 8천의 신들을 굿판으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초감제의 내용은 하늘과 땅, 해와 달, 인간의 세계, 나라와 마을의 시작을 알린다. 그 다음 굿을 올리는 시간과 장소를 아뢴 다음 위계에 따라 신을 굿청으로 초청한다.
신이 내려오는 ‘문열림’과 입춘굿의 가장 중요한 신격인 농경신이 제장(祭場)에 좌정한다. 초감제에 이어 말놀이가 이어진다. 말놀이는 지상으로 내려온 신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타고 갈 다양한 종류의 말을 소개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놀이굿이다. 일명 ‘세경놀이’라 한다. 세경놀이는 여러 심방이 저마다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 등장인물은 ‘여장소무’와 ‘펭돌이어멍’이고, 구성은 여인이 아이를 낳아 농사일을 가르친다는 내용이었다.
#삼도동 부녀회 ‘입춘국수’ 말고
망경루 옆 공터에서는 제주 삼도동 부녀회원에서 ‘입춘국수’ 휘장을 걸어놓고 연신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다. 나의 귀는 입춘굿판에서 흘러나오는 심방의 사설소리를 주어 담고 있었지만, 제주 칼바람 속으로 스며든 따뜻한 국물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저마다 손에 ‘퇴계 이황’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춘국수를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 필수요건이었다. 나 홀로 입춘굿청을 찾은 필자는 순간 배낭 속을 샅샅이 뒤졌다. 다행히 천원을 거머쥐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쉰다. 이유 불문하고 ‘신사임당’을 내밀 경우 필시 부녀회원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이황’을 모시고 입춘국수 행렬의 맨 끝자리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이다.
#낭쉐가 어른아이의 끝소매를 부여잡고
망경루 앞에서 제주 심방이 입춘굿을 올리는 가운데 필자는 관덕정의 공간을 둘러보았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표정을 스케치하기 위해서였다. 한 모서리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뒤엉켜 있었다. 어느 공방지기가 낭쉐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기도 하고 실습생을 상대로 강습하고 있었다. 그 즐거움을 어른 아이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촘촘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간택하여 배낭에 챙겼다.
지금도 연구실에 자리 잡고 있는 목우를 들여다보면 탐라국 입춘굿판이 눈에 선하다. 풍요를 기원하는 봄의 제전은 제주도 이외에 김해의 춘경제(春耕祭),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나경(裸耕), 강원도 삼척의 입춘제(立春祭) 등이 행해졌다고 한다.
오늘날 입춘이 찾아와도 선뜻 인사를 건네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이 많이 아쉽다. 임인년 탐라국 입춘굿은 COVID-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내년에는 그 흥겨운 한마당을 우리 모두 현장에서 접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김경옥(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정리/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48]생태 위기 극복하는 보고의 섬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47]개발 제물로 전락한 섬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 = 46.바다 물때지식의 두 체계와 현대적 활용의 혼돈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50]기본소득 논의는 섬지역부터 시작해야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1]뉴노멀 '섬 정체성' 실천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2]서남해 도서의 국가급 어업유산 ‘미역’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3]연륙과 주민 행복의 상관관계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4]섬에 산다는 것과 편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