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 때 물 위로 드러난 조간대 이용 미역 채취 ‘눈길’
어업 문화유산 11개중 3개가 미역 관련 지정
조수간만 차 크고 물 탁한 서남해서 주로 발달
바위 청소·물 끼얹기 등 생산량 증가 기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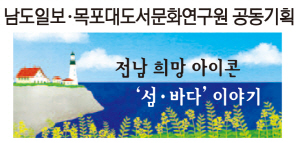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모두 11개가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역 채취와 관련해서는 ‘제주 해녀어업’(제1호 2015년 12월 지정) ‘(경남)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제8호 2020년 6월 지정)과 ‘(경북)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제9호 2021년 8월 지정)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경북이나 강원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던 미역 채취 어선인 떼배에서도 트릿대 혹은 틀이로 불리는 도구를 넣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종의 어선을 이용한 채취 방식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 해녀의 잠수 채취와 낫대와 트릿대를 이용한 선상 채취 방식의 두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 셈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곳에서 물밑 바위에 자생하는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발전한 기술이다. 특히, 난바다 어업이 일찍부터 발달한 동해안에서 발전한 미역 채취 전용선인 떼배는 한국 어민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주는 기술이기도 하다.
11개의 지정유산 중 3개가 미역 채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 미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는 위의 두 가지 기술 외에도 어업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기술이 한 가지 더 존재하였다. 바로 썰물 때 물 위로 드러난 조간대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술은 수심은 얕고 바위 지형이 발달한 경북 동안의 남쪽 지방에서도 일부 나타나지만,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비교적 탁해 수심이 깊은 곳에 미역이 서식하기 어려운 서남해(서해 포함)에서 발달하였다. 서해와 서남해 중에서도 주로 갯벌이 적고 바위가 많은 곳, 즉 낙도나 충남 태안반도 일부 지역에서 산견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미역이 자생하는 서남해 도서 지방에서는 과거와 다름없이 미역바위를 공동 관리하며 과거와 거의 다름없는 방식으로 미역을 생산하고 있다. 서해의 조간대 미역 채취는 동해나 동남해와 같이 어선이나 물 속에 넣어 미역을 자르거나 감아 올리는 장대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썰물 때 물이 빠진 바위에 걸어나가, 해녀가 사용하는 짧은 낫으로 미역을 베어 바구니 등에 담아 돌아온다. 간혹 잠수하기도 하지만, 미역이 조하대의 깊은 곳에서는 자라지 않기에 해녀처럼 숨을 오래 참는 잠수를 하지 않는다.
서남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대신에 미역바위에 대한 소유 의식이 발달해 있었다. 전남에는 유인도뿐 아니라 무인도도 매우 많은데, 미역이 자라는 작은 암초 하나 주인이 없는 곳이 없다. 주인은 개인이 되기도 하고 공동이 되기도 하고 마을이 되기도 하였다.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도 존재한다. 경북 동안의 얕은 바다와 같이, 서남해 도서에서는 미역포자의 착상을 돕기 위해 바위를 청소하는 기세 작업이 널리 이루어졌다. 또, 물 위로 드러난 어린 미역이 봄철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말라죽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끼얹어 주기도 한다.
또, 서남해 도서 지방에는 상품성이 높은 가새 미역이 많이 서식한다. 가새미역은 19세기 초 정약전이 감곽이라고 부른 것이다. 반면, 정약전은 넓미역이나 떡미역이라고 부르는 석미역을 감곽아재비라고 칭하였다.
사실 우리가 미역이라고 통칭하는 해조류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한반도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전개해 왔듯이, 한반도의 각지에는 조금씩 다른 미역들이 서식한다. 15세기 문헌을 보면, 각 지역의 공납물로 곽(藿), 조곽(早藿), 분곽(粉藿), 상곽(常藿), 사곽(絲藿)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다양한 곽은 채취 시기나 품질에 따른 분류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별로 채취하는 미역의 종이 다르기도 하다.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는 미역 외에도 구멍쇠미역, 쇠미역, 나래미역, 넓미역, 다실미역, 빗살미역 등이 자생한다.
서남해 도서 지방에서는 남방계 미역보다 상품성이 높은 북방계 가새미역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남달랐다. 특히, 서남해 낙도에서는 한반도의 다른 지역이 봄철에 미역을 채취하는 것에 반해 여름철에 채취한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19세기 말 전라감영에서 사용하던 수산물을 보면 해삼, 숭어, 민어, 굴, 조기, 명태, 문어, 청어, 홍합, 김, 붕어, 은어, 대하, 대구, 전복, 고등어 등 매우 다양했다. 이중에는 감곽, 즉 미역도 있었다. 감곽은 각 어촌에서 음력 2월 말에서 6월말, 즉 봄철에 상납하던 것도 있었지만, 전체의 1/3 가량은 10월에 상납되었다. 전라감영은 이렇게 거두어들인 미역을 선별해 10~1월에 걸쳐 삭선(朔膳) 등의 명목으로 왕실에 진상하였다. 봄철에 거둔 미역은 전남 남부 도서에서 온 것일 것이고, 가을철에 거둔 것은 전남 서남부 도서에서 여름에 채취해 건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전남 도서지방의 미역의 가치는 일찍부터 중앙에 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궁방과 아문이 서남해 도서를 직접 지배하며 해조류 등을 수세해 갔다. 여기에 중요한 상품이기도 한 미역이 자생하는 바위를 관리하기 위해, 섬사람들은 공동체 규칙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지금도 많은 서남해 도서에서는 미역바위가 공동체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미역바위에 대한 채취권을 바탕으로 공동체 규율이 운영되고 있다.
정말 그렇다. 서남해 조간대 미역 채취 어업은 한반도 서남해 어민이 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어업문화의 일부이다. 제주도 해녀, 동해 떼배(낫대와 틀잇대) 미역 채취 어업과 함께 서해 도서의 조간대 미역 채취 어업은 한국 어민이 전개해 온 미역 채취 어업이 보여주는 기술적 다양성의 중요한 조각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다.
글·사진/오창현(목포대 교수)
정리/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1]뉴노멀 '섬 정체성' 실천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50]기본소득 논의는 섬지역부터 시작해야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이야기=[49]제주도 입춘맞이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3]연륙과 주민 행복의 상관관계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4]섬에 산다는 것과 편리함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5]섬과 근대문화유산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6]고령화된 섬, 어업문화 장인이 사라진다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7]신안 반월·박지도, 진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만들어
- 전남 희망 아이콘 ‘섬·바다’ 이야기=[58]기후와 식생, 그리고 섬 문화의 변화

